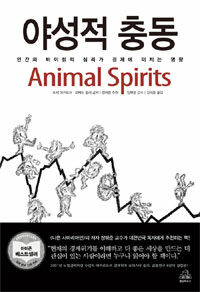 |
야성적 충동 –  조지 애커로프, 로버트 J. 쉴러 지음, 김태훈 옮김, 장보형 감수/랜덤하우스코리아 |
우리나라 집값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집값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발 경제 위기 탓에 부동산 가격이 모든 경제위기의 기초가 된 탓이었다. 국내에서는 보통 KB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많이 삼지만 미국에서는 S&P/Case-Shiler라는 지표가 주택 가격 대표 지수로 알려져 있던 탓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표에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Shiller’라는 명칭에 대단히 친숙해졌을테다.
이 책의 저자가 바로 S&P/Case-Shiller 지표의 창시자인 로버트 쉴러였다. (어찌나 친근하든지..;;)
Animal Spirit
보통 책을 받으면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껍질을 벗긴다. (계속 가방에 넣어다 뺐다 하면 겉표지가 찢어지거나 지저분해지는 탓에 읽는 동안에는 벗겨놨다가 나중에 다 읽고 다시 입히곤 한다.) 이 책도 예외없이 벗겼는데, 제목이 영어로 적혀있었다. Animal Spirit 이라고. 주변에서 무심코 책 제목이 ‘동물 정신’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는..;;
야성적 충동
케인즈가 했던 이야기라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다른 인물들이 했던 이야기를 케인즈가 좀 유명하게 만든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쨓거나, 필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용어를 처음 접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쉽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경제학’이라는 건 사람들이 ‘합리적’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경제적 인간’이라고 하면 이성이 시퍼렇게 살아서 모든 일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때 처음 접근은 이성적으로 시작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은 감성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게 통설이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건데 그러면 지금의 경제 위기가 잘 설명도 안되고 해결도 안되다보니 ‘야성적 충동’이라는 이야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자신감
결국 모든 경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 오늘 우연찮게 SBS의 다큐멘터리 한편을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인 사람들을 끄는 매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에서 뿜어나오는 에너지라고 했다. 경제도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딱 6개월만 시간을 되돌려보자. 1년 이상은 기억할래도 안날테니;; 3월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당시 언론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종말로 치닫고 있었다. GM이 파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떨어지던 S&P 지수에 끝은 있는가, 오늘 파산한 기업, 현재까지 실직한 사람 수 등 부정적인 이야기 일색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포춘을 보니 지금이라도 주식 시장에 뛰어 들어야 하나? 라는 기사도 있던데, 국내에서는 과감하게 이전 고점을 뚫을꺼라는 이야기까지 슬슬 고개를 든다. 주식이 아니라 환율도 마찬가지다. 1달러 1,600원이 언제였는데 그새 1,200원 밑으로 기어내려 가버렸다.
시장의 효율적인 움직임,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의 위력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상들이 아닌가 싶다.
좀더 극명한 예로 ‘뱅크런’을 들 수 있다. 한 은행 지점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왁자지껄 시끄러운 가운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왜 그러지는 물어봤다. “이 은행 망한데요.”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진다. 이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해 돈을 받을 수 없을까봐 서둘러 주변 지점으로 달려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한다. 어느 언론사에서 이 사태를 눈치채고 한 지점의 상황을 TV로 보여주게 되고, 이 은행의 전국 지점에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은행이 가진 돈 주면 될 것 같지만, 문제는 은행은 항상 고객들이 맡긴 돈의 몇 %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다른 방식의 투자를 통해 써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순간 급작스럽게 예금인출 요구가 들어오면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 5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이었던 ‘베어스턴스’가 이와 비슷한 현상에 시달리다 결국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 ‘뱅크런’은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자신감 상실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 때문에 은행이 망하는 사태를 가져왔다. 경제에서 자신감이 가지는 의미가 이와 같다는 것. 2000년대 중반까지 다들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했기에 문제될게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옆에 있던 사람도 이 분위기에 감염되었다. 결국 이것이 전 경제를 감염시켰고, 경제는 망가졌다.
반대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이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선순환이 된다는 것.
따라서, 국가는 국민들의 자신감을 살려주기 위해 무한대의 자금을 쏟아붇는 것이다. 언제까지? 자신감이 살아날때까지 다들 이제 경제는 문제없어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할때까지 손익판단없이 무조건 쏟아붇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세계 흐름이다.
과연 ..
케인즈의 이야기도, 그렇다고 시장주의자들의 이야기도 잘 모르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야성적 충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케인즈 이야기에 충실해 돌아가던 세계가 어느 순간 시장 중심으로 바뀌었고, 실제로 최근까지 그 흐름이 지속되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 극단에 위치한 이 두 가지 이론 중 어느 하나가 맞는게 아니라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있는 뭔가가 더 맞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문득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by 신장섭 (2008.10)‘에서 보았던 중간적인 위치가 떠오르기도 한다.
화폐착각
아, 그러고보니 책에서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봤었다. 화폐착각이라고.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표현한 말인데, 예를들어 내년에 물가가 10% 오르는데 연봉이 10% 오르는 것과 물가가 5% 빠지는데 연봉이 변동없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다들 연봉 10% 오르는 걸 무심코 선택할 것이다. 지금이야 물가 오르는 걸 친절하게 정확한 수치로 눈앞에 보여줬으니 그렇지 ‘티나지 않는 세금’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실제로 현실에서 숫자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게 화폐 착각이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더없이 중요한 개념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리로 알뿐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잘 구분하면 좋을텐데..
….
책을 덮으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물론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아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정말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내심 찜찜한 마음을 버릴 수 없었다. 케인즈가 썼다는 ‘일반이론’을 난 구경조차 한적 없는데, 그저 여러 책이나 백과사전에 나오는 단 몇 단락으로 케인즈의 이론을 이해하려다보니 깊이있는 생각을 남기기 어려웠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다지만, 지름길로 갈게 있고 돌아가도 정도를 걸어야 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더 늦기전에 케인즈를 비롯한 슘페터, 나이트 등 머리속에 담아둬야할 인물들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중간에 화폐착각을 투자와 연결한 부분있자나요. 여기 조금만 더 설명해주세요^^;
투자와 연결했다는게 뭐지?;;; 기억이 안나는데.. ㅡㅡa